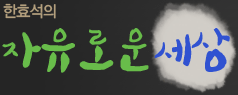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빠나나 – 정문성
정문성(주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요즈음 손님이 오시거나 아이들 친구가 왔을 때 시원한 과일을 내 주면 누구나
좋아해도 바나나를 내 놓으면, 어른은 물론 아이들 조차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
다.
십오륙년 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과일이 바나나
였다. 시내 백화점이나 커다란 과일 가게에 가야 천정 가운데 빨간 노끈으로 한
송이씩 매달려 있던 바나나. 과일 가게 주인도 정말 특별한 손님이나 만나야 한
송이를 팔아 볼까, 두어 개씩 떼어서 팔던 바나나였다. 그시절엔 누구나 바나나
노오란 껍질을 주욱 벗겨 한개만 먹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큰 딸아이 첫 돌 잔치때 돌 상이 너무 초라했던지 손위 시누이는 야구 장갑만
한 바나나를 한 송이 사다 놓아주어 돌 상을 빛내 주기도 했었다. 딸아이가 첫걸
음을 배워 아장 아장 걸을 때 바나나를 보면 손을 잡아끌고 손뼉을 치며 좋아하
곤 했다.그럴 때면 남편은 평소에 나오지 않던 비상금으로 딸애 바나나를 사주
는 일에 큰 인심을 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먹고난 속껍질이 아까워 칼로 긁어 먹어본 일
도 있다. 다 먹고난 껍질조차 버리기 아까운 마음이었다. 단맛 하나 없지만 감미
로운 그 향기 만으로도 맛을 즐기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중풍으로 쓰러져 누워 계시던 친정 큰아버님은 멀리 떨어져 살던 시집간 큰 딸
이 사온 바나나를 드시지 못한채 눈을 감으셨다. 약간 덜 익은 바나나를 녹익혀
드린다고 장농 위에 놓아 두었던 것을 보시기만 하다가 바나나가 노랗게 익기 전
에 세상을 뜨신 것이다. 그때 큰아버지 제사상에 놓인 바나나를 보며 가족 모두
가 애절해 했던 가슴 저린 사연도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사에 참석하
는 가족들은 제사상에 놓을 바나나를 사오곤 한다.
Banana는 글자 그대로 바나나이다. 정확하다는 아이들의 발음을 빌면 버네이너
라고 해야겠지만 바나나의 아줌마식 발음은 역시 빠나나이다. 그래야만 그 아련
하고 달콤했던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다. 너무나 먹고 싶었던 것을 먹지 못했던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요즘은 바나나가 너무 흔해져버린 탓에 식탁에서 굴러다니다 물러져 버리는 일
도 종종 생기곤한다. 하지만 나는 바나나를 보면 먹거리가 귀해 마음껏 먹어보
지 못했던 그 옛날이 그리워진다. 그래서 가족 아무도 반기지도 않는 바나나를
볼 때마다 노랗고 커다란 3000원짜리 바나나 한송이를 사곤 한다.
“아저씨, 빠나나 한송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