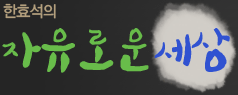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허수아비-신옥
신 옥 (주부, 부천시 원미구 상동 한아름)
여기저기 푸르름으로 한껏 자태를 드러내던 나무엔 오월의 신부 같은 단풍이 아
름다움으로 휘감고 있다. 한 해 농부의 수고로움이 풍요로 들녘을 가득 채우고
그 곁엔 허수아비가 말없이 웃고 있다.
제 할 일을 다 끝낸 안도감으로 너울대는 바람에 제 몸을 맡기고 있다. 텅 빈
나뭇가지에 오롯이 홀로 남아있는 잎새마냥 서있다. 허수아비는 한 자락 강풍이
휩쓸고 지나가도 꼿꼿한 자태로 올곧게 서 있었고, 고통의 흔적을 훈장처럼 주렁
주렁 새긴 찢기고 찢긴 세월의 옷을 입고 있다. 때론 뿌리 채 흔들거리면서도 비
스듬히 겨우 서있는 허수아비가 있다.
오늘도 난 전화를 건다. 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가 계시는 요양소로. 그리고 그
엄마를 보내고 혼자 고향집에 남아계시는 아버지께. 목소리는 일부러 맑게 말꼬
리는 한껏 올린다.
“엄마 걱정은 말고 네 몸이나 생각해라. 난 괜찮아.” 늘 똑같이 끝을 맺는 엄
마.
“걱정 없다. 반찬도 냉장고 가득하고 밥도 잘 해먹는다.” 무엇이 걱정이냐는 당
당하신 아버지. 그 많던 자식 잘 키워놓으셨건만, 자식 덕볼 만도 하련만……
혼자 계시면서도 자식에게 불편함 주지 않으려 본인이 편하다며 서울로 올라오
실 생각도 안 한다.
몇 달 전에 친정 가족이 우리 집으로 모였다. 스무 명이 넘는 대가족이 모여 저
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의 만남에 혈육의 정이 새록새록 피어오
르고 있을 즈음 할 얘기가 있다는 언니 말에 떠들썩한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
다. 친정 아버지가 열흘 넘게 입원했다가 며칠 전에 퇴원했다는 것이었다. 뜻밖
의 말에 우린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
다.
일흔 일곱 해를 사시면서 병원 한 번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아버지였다.
한두 달 전부터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를 드시다가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도
별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며칠 전 밤에 숨이 막힐 것 같은 통증으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셨단
다. 의사는 간도 나쁘고 황달도 심해 당장 수술이 급하다고 했다. 암으로 투병중
인 엄마는 너무 놀래 그때서야 가까이 사는 며느리에게 연락해 큰 병원으로 옮겼
다. 종합검사를 한 결과 다른 곳은 다 건강하고 담낭에 돌이 생겨 담낭관을 막았
다는 것이었다. 수술도 간단히 내시경으로 했다.
아버지는 열흘 넘게 병원에 계시면서도 엄마나 며느리조차 가끔씩 오게 하고 혼
자서 입원해 계셨다. 그런데도 서울에 있는 자식들은 아무도 몰랐다. 자식이 일
곱이나 있는데도 누구 하나, 그 흔한 음료수하나 꽃다발 하나 드리지 못한 채 아
버지 혼자 계시게 하고 말았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입원하셔서 자식들에게 대접도 받아보고 싶었을
텐데 어찌 그럴 수 있나 싶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버지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화해도 끝내 얘기 안한 엄마도 야속했다.
부모님은 결혼식이나 종친회 일로 서울에 와도 전화만 하고 가신다. 부모님 올
라오면 음식 준비하고 차비 주니 경제적으로 자식들 힘들게 한다고 그냥 내려가
시는 것이었다. 또 명절이나 생신 때도 힘들다, 돈 든다 하며 내려오지 말라고
늘 그러셨다. 자식 보고싶은 마음이야 여느 부모와 다를까 마는 그 속내조차 드
러내지 않는다. 그저 자식 형편 헤아리느라 본인들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하긴
처음으로 중국 여행하실 때도 출발 바로 전에야 공항에서 전화하신 분들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입원한 사실까지 몰라야 했던 자식인
난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젠 나이도 많고 병든 몸이니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일 것이
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려하고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
려 하는 것이 더 속상하다. 평생을 남에게 신세 안 지고 사는 것은 좋은데 자식
에게조차 그러실 땐 섭섭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나도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땐 가끔 섭섭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끝없이 묵묵히 주기만 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넘지 못할
거대한 산처럼 깊고 큰 모습으로 늘 자라잡고 있다.
다시 전화를 건다. 쑥 뜸과 단식으로 지친 듯한 엄마 목소리. 엄마가 없으니 집
에 들어오기 싫다며 웬일로 말끝을 내리시는 아버지.
“그러니 제발 서울로 오세요.” 울컥 치미는 설움에 짜증을 담아낸다.
“엄마도 없는데 집에 있어야지. 엄마 다 나아서 오면 그때 가마.”
잘 안 들려서인지 늘 크게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묻혀진
다. 오늘도 아버지는 한 줌 쌀을 씻고 밥솥에 불을 켤 테지… 난 전화기를 힘없
이 내려놓는다. 곱게 단풍으로 채색된 나무에도, 텅 빈 들녘의 허수아비에도 햇
살이 거두어지고 노을 몰래 따라온 어둠이 내려앉는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서 허수아비처럼 웃고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