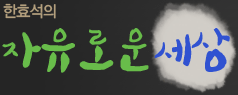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새벽 외출-권명옥
권명옥(주부, 부천시 거주)
게으름을 마냥 피우면서 일어나도 좋을 일요일, 어제 밤 맞추어 놓은 자명종 시
계소리가 들리기 전 눈을 떴다. 가족들의 곤한 잠이 방해가 될까 까치발을 해가
면서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 설 때였다. “추운데 옷 잘 입고 가지” 언
제 깨었는지 등 뒤로 남편의 소리가 들린다.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어 보이고 서
둘러 집을 나선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의 공기가 차갑다.
상가 건물의 셔터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 이 시각, 오고가는 사람마저 뜸하다.
영업용 택시가 줄을 지어 승객을 기다리고 있고, 사람을 서 너 명씩 태운 헐렁
한 시내버스가 지나간다. 겉옷 깃을 올리고, 등을 돌려 찬바람을 피해본다. 여전
히 기웃거리며 파고드는 찬바람에 목덜미가 자라목처럼 움츠러든다. 버스정류장
에서 서성이던 대 여섯 명의 사람들도 저마다 기다리던 버스 속으로 사라지고 영
등포까지 실어다줄 905번 버스는 좀체로 보이질 않는다.
두 발을 번갈아 옮겨 놓으면서 동동걸음을 걸어보지만 고드름을 발가락에 엮어
놓은 듯, 발끝이 아려온다. 대전에 살고있는 셋째의 마흔 번째 생일을 맞아 며
칠 전부터 마음먹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지내던 형제들과 모두 만나기로 약속도
해두었다. 모처럼 모여 외식도 즐기면서 생일을 축하해주려는 것이다. 셋째가 얼
마나 마음 뿌듯해 할까? 불혹의 나이를 먹도록 생일을 기억은 했을 뿐 무심히 지
나쳐왔다. 이제 잃어버리고 지내던 생일을 챙겨보려고 나선 길에 추위가 따라나
서니 얼마쯤은 고달프다.
어머니는 어릴 적 딸들의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내셨다. 아들에게
는 붉은 팥 고물에 수수경단을 빚어 10년을 정성스레 챙겨주면서 딸들의 생일은
까마귀에게 던져주었는지 잊고 살았다. 그런데도 딸들은 서럽고 야속한 생각은커
녕 당연한 듯 순종하며 자라왔다. 나이가 들어 자식 낳아 키우면서 아들보다 못
한 관심을 받고 자랐다는 서운한 생각이 싹이 되어 한길 마음속을 뚫고 나온다.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게 어디 나의 뜻이고 의지였나?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픈 손
가락이 따로 있는가? 하늘의 뜻도 살펴서 행할 나이에 철딱서니 없는 소견이 뾰
족이 자라난다.
희미했던 주위는 어느새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목을 빼고 기다린 버스가 눈 안
으로 들어올 때 기다림에 끝이 보였다. 눈이 내려 쌓인 도로 위를 새롭게 단장
한 905번 버스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앞에 멈추고 문이 열린다. 시간이 이른 탓인
지 승객은 없었다 사람의 손때가 묻어 있지 않은 차안에 잔잔한 음률만이 가득
실려있었다. 버스 안은 훈훈하다. 어젯밤 좋은 꿈이라도 꾸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만족한지 운전기사의 표정이 밝아 보인다.
텅텅 빈 좌석들, 맨 앞자리를 정해 눌러 앉으니 차창 밖의 거리가 한 눈에 들어
온다. 평소 그토록 붐비던 도로 위에 차량들이 휴일을 맞아 한산하다. 시민회관
을 지나 심곡동에서 젊은이 한 사람을 태운 버스는 부천 남부 역 을 지나서야 예
닐곱 명을 더 태울 수가 있었다.
버스는 뻥 뚫린 도로가 신이 난 듯 내닫는다. 모자란 잠을 채우려 졸고 있는
지? 눈을 감고 있는 사람과 차창 밖 거리에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사람들로 조용
하다. 내릴 곳을 알려주는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니와 약속한 시간에
늦지는 않을까? 시계를 내려다본다. 만나기로 한 8시까지는 넉넉할 것 같다.
다음 생일은 내 차례가 된다. 그 다음은 언니 차례고, 막내가 가장 늦게 생일
축하를 받게 될 것이다. 집에서 귀히 여기는 강아지가 되어야 밖에 나가서도 대
접받는다는 우리의 옛말이 참으로 맞는 말인가 보다. 어릴 적부터 알아주지도 챙
겨보지도 않던 생일이니,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뤄 가족들이 있어도 잊고 지나치
기가 일쑤였다. 내 생일이라고 알려주기는 자존심이 구겨져서 그냥 지나친 후 입
안에 꽈리를 물고 지내기가 한두 번인가?
문래동을 지나 영등포 사거리에서 종착지를 알려주는 안내 방송이 들린다. 버스
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200여 미터를 지난 뒤에 문을 열었다. 언니와 만나기로
한 736-1 번 버스가 서는 곳으로 정신 없이 걸어가는데, 언니가 먼저 나를 알아
보고 손짓을 한다. 작년 키보다 조금 더 작아져 보이는 언니의 팔짱을 힘있게 지
르고 기차역을 향해서 간다. 발을 맞추어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