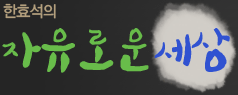외래어 홍수, 영어식 한국말
제 목 : 신문-방송의 ‘영어식 우리말’ 문제많다
외래어 홍수, 영어식 한국말
<중앙일보 안재훈 전문위원>
외래어는 과감하게 많이 써보고 우리말로 승화시키자는
것이 평소 나의 지론이다. 그러나 30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나는 요사이 망칙스런 영어 외래어 홍수에 문화 쇼
크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머리문장부터 ‘쇼크’
란 단어를 쓰느냐고 물으면 그 표현은 이미 잘 통용되는
우리 어휘에 포용된 단어이기 때문이다.
외국말 어휘를 써보는 습관 자체를 국수주의자로서 반대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괴한 복합어를 만드는 것은 신문과
방송인들로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독자
층을 겨냥한 글이거나 신세대 기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보인다.
영어 단어 중에서, 특히 명사 중에서 골라 사용해 보고
일반이 수용하면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이
테크’ ‘패턴’ ‘슬로건’…. 무엇이거나 우리 어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와 동사를 무분별하게 쓰면
우리 고운 말이 지저분해진다. ‘초록 잎사귀’ ‘푸른 하늘’을
‘그린 잎’ ‘블루 스카이’로 문장 속에 넣는 것은 멋있는 게
아니다.
지하철 상품 벽보광고의 한국식 영어나열은 가관이다.
그러나 그런 광고의 표현자유는 억지로 규제할 수 없다.
언어란 바람처럼 늘 방향을 바꾸는 것, 살아 숨쉬는 생동
체다. 언어를 통솔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오직 교육으
로만 순화가 가능하다. 오늘 청바지 문화속의 청소년 속어
는 내일 기성세대의 자연스런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다. 다만 미디어 종사자들의 언어 사용은 조심스러워야 한
다.
문화 자존심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문들은 자주 ‘빅3′ ‘빅
4′라고 쓴다. 스포츠 면에서 시작돼 경제면에도 나타난다.
이것이 ’3강’ ’4강’보다 더 헤드라인으로 적합할까.
신조어의 외국 문물 영향에도 문제가 있다. 무선호출기
를 지칭하는 단어 ‘삐삐’는 ‘비퍼’ 혹은 ‘페이저’라는 정확한
명사가 영어에 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미리 알았다
면 얼마나 좋았을까. 삐삐 삐삐…. 짐승-사물이 내는 소리
를 적을 수 있는 의성어는 한국말만이 가진 큰 장점이다.
우리말 전체가 운율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
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말에 테크놀로지 찌꺼기가 병균처
럼 낀 기분이다.
‘마케팅’은 우리말로 좋지만 기사 제목이 ‘이머징 마케팅’
이라면 영어 사대주의 냄새가 난다. ‘올 시즌 최고 이벤트’
라는 마구 간자장이 된 제목도 눈에 띈다. ‘하이라이트’ ‘이
니셔티브’ ‘소프트 랜딩’ ‘프런티어’까지도 조심스러워야겠
지만 ‘터프 가이’ ‘퍼펙트 경기’ ‘소프트 사회’ ‘시 테크’ ‘셀
프 세차’쯤 되면 혀를 찰 노릇이다. ‘페이퍼리스 사무실’
‘오른발 피니시’ ‘완벽한 인프라’…. 웃어버릴 수만 없는 이
런 잡탕밥 속의 빵조각들…. 신문사 교열부장들은 무엇하
고들 계신가. ‘롱 팔’ ‘롱 다리’는 당장 ‘긴 팔’ ‘긴 다리’로
제자리로 돌아가자.
거듭 강조하지만 이미 많은 영어 어휘들이 우리말에 흡
수돼 사전이 두꺼워지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다.그러나 ‘논
쟁’ 대신 ‘디베이트’라든가, ‘청사진’자리에 어색하게 ‘블루
프린트’가 삽입된 것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물론 ‘컴맹’
‘국제 폰팅’식의 신조어를 보면서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은
모국방문의 애교일 뿐이지 이런 것이 국제화 영어교육은
아닌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신문인들은 가끔 재미있는 칼럼을 쓴다.
미국말 침투를 비아냥대며 자기나라말 어휘를 몽땅 빼버린
채 영어 외래어만으로 글을 만들어보는 것이다. 어떤 독자
들은 이런 칼럼이 해학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넘어간다. 요
사이 우리 신문-방송에 나타나는 영어 아닌 영어만 골라
글을 써본다면 쉽게 코미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텐데 이런
해학을 신문이 실어줄까.
중앙일보 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