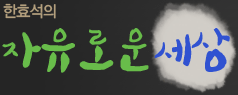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다…-정경미
정경미(주부, 부천시 반달마을 삼익 아파트)
우리 엄마는 남편과 아이, 살림살이밖에 모르는 분이었다. 자식이 많아도 아이들에게
무엇하나 시킬 줄 모르고 당연히 당신 차지인줄만 알고 살았다. 천상 여자이기만 했
던 착하고 고운 성품을 가진 분이었다.
엄마는 해마다 아버지 보약을 챙기셨다. 생강을 져며 생강차 만들고 딸기 궤짝으로
사 딸기잼 만들고 딸기주를 담곤 했다. 겨울엔 뜨개질로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다.
재봉틀로 옷도 손수 고치고 만들곤 했다.
우리 엄마는 손재주가 많고 부지런했다.부뚜막의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도 시멘트 사
다가 개어서 붙이고 문짝의 못이 떨어져도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뚝딱
뚝딱” 망치질을 하기도 했다.
가정 숙제로 수를 놓거나 바느질을 하게 되도 늘 엄마 손이 가야 완성이 되었다. 중
학교 3학년때는 청소시간에 앞치마를 입지 않고 청소를 하면 매를 맞았다. 엄마는 딸
이 학교에서 매를 맞을까봐 앞치마를 들고 정류장까지 단거리 선수처럼 뛰어 오시기
도 했다. 어떤 비오는 날엔,사소한 일로 삐져서 도시락을 팽개치고 학교를 갔다. 점
심 시간 때쯤, 우산을 들고 장화까지 신은 모습으로 웃으며 도시락을 내밀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어느날 아침 눈을 뜨면 나와 동생들의 열 손가락엔 실로 묶은 비닐 조각이 조롱 조
롱 매달려 있기도 했다. 우리들 손톱에 예쁜 봉숭아 물을 들여 주려고 또 늦은 잠을
청하셨겠지.
엄마에 대한 나의 기억은 항상 그리움으로 절절하다. 오래 전에 신문에서 “난 엄마
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책 선전 광고를 보았다.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 그대로의 내용일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엄마처럼 모든걸 희생하고 빈 쭉정이
처럼 살진 않겠다는 뜻의 반어법적인 표현일거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의 제목이 눈에 많이 거슬렸고 기분이 조금 상했었다. “아니,우
리 엄마가 어디가 어때서?” 사서한 고생이 많으니까 부분적으로는 닮고 싶지 않은 점
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난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아이들의 부주의로 생겨난
일로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
다.
아이가 실수를 할 때마다 화를 내기 일쑤였다. “나는 너랑 못살아. 제발 없어졌으
면 좋겠다.” 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어린 자식에게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인내심 없는 나 같은 엄마보다는 잘 참고 토닥거려 주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는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늘 모자랐다. 엄마의 가슴속
에 어찌 다른 욕심이 없었을까. 그렇게 자식들에게 들볶이며 살았어도 소녀같은 미소
를 잃지 않았던 우리 엄마처럼,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