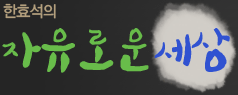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내가 만난 천사 -김은미
김 은 미(주부, 부천시 상1동 한아름마을)
겨울 일요일 어느 날이었다. 우리집 뒤에는 오래된 성당이 있었다. 고즈녁한
그 성당에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종소리를 울렸고. 은은히 울리는 종소리는 때때
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그 날은 유난히도 보채는 작은아이 때문에 온몸이 지친 상태였다. 가까스로 아
이를 재우고 쓰러지듯 소파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 저녁 여섯시 어김없이 종소리
가 울렸다. 막연히 그 종소리에 이끌려, 성당으로 갔다. 한녀석은 손을 잡고 잠
든 한녀석은 포대기로 꽁꽁 동여 매업은 채 걸음을 재촉했다.
성당 안은 꽤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끝모퉁이에라도 앉아 신부님의 말씀을 듣
고 싶었지만, 한 살 두 살 두 녀석들은 나를 서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성당 안
에만 들어서면 자지러지는 작은아이의 울음소리와 답답하다고 징징대는 큰놈의
찡얼거림에 어쩔 수 없이 바깥에서 귀만 문안으로 들이댄 채 어영부영 미사가 끝
이 나고 말았다.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다. 계단을 내려와 성모마리아
상 앞에 서있는데 누군가 내옆으로 다가왔다. “애기엄마, 어디살아요. 나랑같이
가요. 내가 바래다 줄게요. 어휴! 이녀석 좀 봐 장갑도 안 꼈네. 춥겠다. 아줌
마 업고 가자.” 허름한 옷차림의 깡마른 아줌마였다. 그 아줌마와 난 어두워진
골목길을 함께 걸어왔다.
“아이가 둘이네 그것도 사내녀석만, 힘들겠어요”
“네, 아이들이 연년생이라 많이 힘들어요.”
“아빠가 많이 도와주지 않나요”
“애 아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걸요.”
“저런, 내가 시간이 되면 아이라도 좀 봐줄텐데……”
아줌마는 성당문 밖에 서있는 나를 보고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고 한다. 마치 십
오 년전의 자기 모습을 보는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아이를 들쳐업고 또 한 아이
를 손잡은 채 문가에서 쩔쩔대는 모습이 연민을 자아냈나보다. 십오 년전 아줌마
는 힘겹게 아이들을 동반한 채 성당에 왔으나, 성당사람들이 냉정하고 차가웠고
따뜻이 감싸주는 이 하나 없이 문가에서만 서성이다 돌아가곤 했다고 했다.
아줌마는 처음 만난 사람같지 않게 정말로 날 안스러워하고 있었고 자신은 세종
병원에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집에 다달은 후 차를 대접하려 했을
때 조금 후에 오겠다며 어디론가 가버렸고 잠시 후에 무엇인가 하나 가득 가져
왔다. 귤 한 보따리, 사과 한 보따리, 아이들 과자 종합선물.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와 세제까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나에게 아줌마는 오히려 민망해 했다. “애기엄마.
미안해요. 내가 일요일날 빼구는 매일 열 시나 되야 끝난다우. 어쩌지 아이를
못 돌봐줘서.” 고맙긴 했지만 부담스러웠다. 아줌마의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난 아줌마에게 아무 것도 아닌데, 그저 처음 만난 이웃에 불과 할 뿐인
데…..
그 이후에도 아줌마는 친정엄마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로 일요일이면 불쑥 나타
나 혼자하기 힘든 아기목욕이며 집안일까지 성심껏 도와주곤 했다. 힘든 병원 청
소일에 지쳐 일요일이면 쉬고 싶을텐데도 늘상 웃는 낯이었다. 때때로 아줌만 꽃
을 한아름씩 선물하기도 했다. “병원에 문병 온 환자들의 꽂인데 청소하러 들어
가면 나를 주곤 한다우. 백합향이 너무 좋지 않우.” 그러기를 몇 달. 그 아줌마
네 아저씨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다며 아줌마가 훌쩍 떠났다. 아줌마는 더 많
이 도와주지 못함을 애석해 하며 떠나셨다.
아줌마가 떠난 후 난 너무 깊은 상념에 잠겼다. 받기만 하고 하나도 갚지 못했
는데…… “그래 맞아, 아줌마는 천사야. 아이들에게 지쳐 몸과 마음이 상한 나
를 위해 찾아온 천사. 저녁종 소리는 천사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고, 행여나 우울
증으로 치닫기 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은밀히 보내준 천사야…….”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삼종 종소리도 울리지 않지만 성모상 앞에 서 있으
면 어딘가에서 아줌마가 나타날 것 같다. 그 때처럼 따뜻한 미소의 허름한 천사
님이 내 곁으로 다가 올 것 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