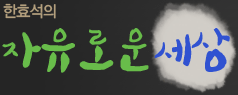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아버지의 손 – 이연진
이연진(주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한아름 아파트)
아버지 손을 보면 눈물이 난다. 연민이 흘러 외면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
이 아프다. 40년간 쌀과 잡곡을 만지고 질긴 노끈으로 쌀자루를 묶다 보니 어떻
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손이 거칠어져 있다.
청년 시절, 경무대 헌병을 지냈던 아버지 손은 보기 좋게 다듬어진 단단한 손
이 었다고 한다. 누구보다도 차림새가 단정했던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시절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업을 하면서 아버지 손은 잠시도 쉴 틈이 없
었다. 새벽 6시, 쌀을 기계에 퍼 담으면서 아버지 손은 하루 고된 노동을 시작한
다.
기계에서 나오는 쌀을 다시 한 번 손으로 깨끗하게 골라 내고 자루에 담아 둔
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전화로 주문된 쌀을 배달하고 가게 손님을
맞느라 아버지 손은 바쁘게 움직인다. 또 다시 쌀을 만지고 잡곡을 만지고 쌀자
루를 묶고 배달을 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아버지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손저울이라 할 만큼 정확한 양을 봉투에 담아내고 덤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
다. 쌀값도 거의 깎아 주지 않는 손이었다.
나는 윤기가 흐르는 아버지 손을 본 적이 없다. 하루 종일 쌀겨와 고운 먼지가
여러 겹 덮여 있기 때문이었다. 두 손은 쌀자루를 잡는 모양으로 안으로 굽고 옆
으로 휘어져 볼품이 없었다. 두껍게 굳은살에 꺼칠한 손바닥, 마디 마디가 심하
게 불거져 나온 손가락, 손등마저 굵은 힘줄이 튀어나와 만져 보면 오랜 세월 묵
묵히 견디어 온 나무 껍질과 같았다.
면장갑을 끼고 일을 해도 유난히 세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면 손끝이
나 손가락 마디가 갈라졌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는 가끔 반창고가 감겨 있었다.
바쁘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어쩌다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문을 닫은 늦은 10시경, 아버지는 손을 다듬곤 하셨다. 거친
손톱을 가위로 잘라내고 큰 손톱깎이로 다듬는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과 손등에
있는 굳은살을 칼로 베어 내고 글리세린으로 손 전체를 골고루 펴 바른다. 그러
나 이런 정성도 별다른 의미 없이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다시 허연 쌀겨로 뒤덮
여 있었다.
우리 식구들은 언제나 거칠고 투박해 보이는 아버지 손에 익숙해져 있다. 때로
는 이런 손이 남부끄러워 쳐다보기가 싫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버지 손을 제대로 바라 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