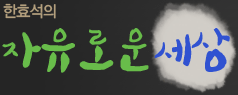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피겨 스케이트-김은미
김은미(주부, 부천시 원미구 상1동 한아름마을)
오늘 피겨 스케이트를 샀다. 예쁘게 포장을 하고 우체국에 가서 천안에 살고 있
는 이제 사학년이 되는 오빠의 딸 민지에게 부쳐 줬다. 며칠 후면 민지 생일이
다. “고모가 뭘 사줄까, 갖고 싶은게 뭐니.” “고모 피겨스케이트 사줘요. 꼭이
요. 빨간 색으로요. 엄마가 위험하다고 안 사주거든요.”
스케이트를 부치고 오는 길에 아련한 옛 생각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집에서 십
여 분만 걸어 나가면 논밭이 있었고, 한 겨울 비어 있는 논두렁은 그대로 스케이
트나 썰매장이 되었다. 오빤 스케이트 끈을 길게 늘어뜨려 어깨에 걸쳐 메곤 했
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언제나 그 스케이트가 작아 져서 나의 차지가 되려나 했
다. 두세 해를 기다려 오빠가 새로운 반짝이는 새 스케이트를 사고 그 스케이트
가 내 차지가 될 때쯤이면 칼날은 군데군데 이가 빠져 있고 신발은 이곳 저곳 헤
어져 볼품이 없었다.
난 빨갛고 앞날이 부드럽게 휘어져 있는 피겨 스케이트를 타고 싶었다. 가끔 여
자아이들 중에 그런 걸 타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부럽던지 내 주머
니에 있는 사탕이랑 껌 모든 걸 다 줘가며 십 분만 빌려 타게 해 달라고 졸랐
다. 피겨 스케이트는 정말 멋있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빨간 피겨스케이트
를 탈 때면 얼음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기
분은 잊을 수가 없었고 그날 밤은 틀림없이 빨간 스케이트 타는 꿈을 꾸었다.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멋진 스케이트를 열 개, 아니 한 백 개쯤 사서 실컷 타야지
생각했다.
사학년 겨울방학 어느 날, 그날은 내 생일날도 어린이날도 아닌데 꿈같은 일이
일어났다. 스케이트가 생겼다. 그것도 그토록 원하던 빨간 피겨스케이트였다. 아
빠가 사 오셨다. 무슨 날도 아닌데 말이다. 날아갈 것만 같았다. 손으로 만지고
또 만져 보며 아끼고 아껴서 타면 십 년은 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꿈은 깨져 버렸다. 그 날밤 우리 집은 난리가 났다. 오빤 징징대며 엄마
에게 떼쓰고, 엄만 아빠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였다. 사 오려면 제일 큰애 걸 사
와야지 기집애 걸 사와 가지고 사내애 기죽게 만든다며 아빠를 몰아붙였다. 엄마
와 오빠의 눈총은 따가웠다. 엄마 말대로 아빠가 뭔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루 꼬박 품안에 품었다가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내 주었다. “그래 착하다.
여자엔 그래야 되는거야. 오빠가 기죽는 건 너두 싫지.” 다음날 엄만 스케이트
를 바꿔 왔다. 당연히 까만 남자 스케이트 오빠 거였다. 스케이트를 바꾼 날 밤
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베갯보가 흠뻑 젖도록 울었다.
그때는 스케이트가 아주 귀했고 큰아이가 사면 줄줄이 내려 신는 건 다반사였
다. 우리 집은 가장 큰애가 오빠였고 또한 남자였으니 내가 피겨스케이트를 탈
수 없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요즘 초등 학생에겐 갖고 싶을 때 가질 수 있는
게 스케이트다. 예전처럼 귀하지도 소중해 하지도 않는다. 우리 집 아이들이 옷
을 아무 곳에나 휙휙 벗어 놓고 물건을 함부로 다루더라도 스케이트만큼은 아껴
서 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