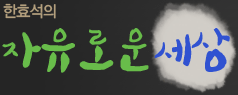그 아이의 눈빛이 싫었어…
요즘 내 머리 속에는 어떤 아이의 눈빛이 맴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눈빛이 아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눈빛, 잊고 싶은 눈빛, 싫은 눈빛이니 어찌 하랴.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며칠 전 시청각실에서 ‘예절교육’이란 게 있었다. 외부 강사가 와서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예절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다. 내가 속한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기도 해서 사진도 찍어둘 겸 시청각실로 들어갔다. 문 앞에 서 있는데 한 아이가 팔짱을 끼고, 몸은 의자에 깊숙이 묻은 채 “추워요. 문좀 닫아줘요.”라고 말한다.
문득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문제는 그 말이 아닌 그 말을 하는 아이의 표정과 몸짓이었다. 불손함. 난 그런 생각밖에 안들었다.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네가 닫아라.”
그러자 그 애는 역시 아까 그 몸짓 그대로 말하는 거였다.
“애들 들어오네요. 안닫아도 되겠네.”
난 순간 열이 치밀어 올랐다.
“너 지금 이런 행동이 뭐지?”
“뭐가요?”
“너 이리와 봐.”
난 아이들 데리고 시청각실 바로 앞에 있는 교무실로 왔다.
야단을 칠 때도 아이들을 의자에 앉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 아이를 의자에 앉게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말해봐야지 생각하며…
“자. 만일 네 후배가 아까 너처럼 팔짱 끼고 앉아서 문좀 닫으라고 말했다면 넌 어떤 기분이겠니?”
“기분 나쁘죠.”
“그럼 너 아까 너의 행동이 바르다고 생각하니?”
“아니오. 잘못했어요.”
아, 말은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아이의 눈은 비딱함과 불손함으로 이상한 빛을 내고 있는 건가.
“잘못 했다는 사람 태도가 이게 뭔가?”
“원래 이런데요.”
“너, 처음 보는 여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니?”
“전 남자선생님한테도 이래요.”
“이런 태도 고쳐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쉽게 안 고쳐져요.”
그날 처음 보는 아이였다.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 반 아이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애는 오만불손했다. 그렇게 보였다.
소리지르며 야단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름이 다 끼쳤다.
그애에게서 이그러진 모습을 봤다. 남자 아이들 속에 자리잡은 우월의식. 남자라는 우월감에 여자선생님에 대한 은근한 무시. 무력이 아닌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삐딱한 반항심. 오히려 인간적인 접근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오만해지는 뒤틀린 모습.
몇 마디 말을 던졌지만 나를 쳐다보는 그 아이의 자신만만한 눈빛.
‘흥. 아무리 그래 봐. 넌 매를 들지도 않고 힘없는 여선생이야. 기껏 야단쳐봤자 말 몇마디밖에 더하겠어. 나를 어쩌겠어.’
그렇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나는 순간 무력감을 느꼈다. 그 아이의 태도를 갖고 계속 나무라봤자 나는 치졸한 선생이 될 수밖에 없는 묘한 상황. 더 야단칠 수가 없었다. 내가 강사를 모시고 가야했기에 그애를 더 야단칠 시간이 없었다. 시간뿐 아니라 막막해서… 앞으로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공허한 말 몇 마디 더 하고 아이를 시청각실로 돌려보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의 장면. 난 그애의 그 싫은 눈빛 때문에 며칠 동안 속앓이를 했다. 솔직히 마무리를 못하고 돌려보낸 게 후회되었다. 그 애 말마따나 쉽게 고쳐질 수 없다면 계속 불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었어야 했다. 확실하게 야단을 쳤어야 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쳤어야 했다. 몇 마디 말로 수긍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더 긴 시간을 써서라도 …
그런데 그앤 내가 수업하는 반 아이도 아니다. 다시 불러내려도 기회는 사라졌다. 난 앞으로도 한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를 취했던 그애의 얼굴. 미움과 약삭빠름과 뒤틀림이 가득했던 그 눈빛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고생을 해야 한다.
교사로서의 무능한 나를 자책하며…
내가 희망이라 여기는 아이들의 싫은 모습을 생각하며….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들의 그 오만한 행동에 이중의 고통을 느끼며…
만일 내가 그 아이와 더 긴 시간,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애에게서 좋은 점을 봤을 지도 모르는데… 그 눈빛이 순한 눈빛으로 바뀌는 걸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힘든 건 내가 그 순간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아이에게 나는 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앞으로 한참 동안 나를 괴롭힐 것 같다. 그 애의 그 눈빛은 한참 동안 가시가 되어 내 마음과 생각을 찌를 것 같다. 내가 끝까지 해보지 않은 것이 또한 가시가 되어 나를 오랫동안 찌를 것 같다.
다시는.. 다시는 …이렇게 이렇게 어리석게 마무리하지는 않겠다고, 다시는… 다시는… 교사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그 눈빛, 그 가시는 누그러지지 않는다……어쩔 수 없지. 계속 나를 찔러라. 그래야 잊지 않겠지. 그래야 제대로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