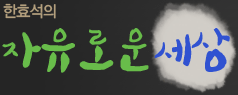광주를 다녀와서 – 저 모처럼 효도 했나요?-신엘라
이름 : 신엘라 ( sok0822@hanmail.net) 날짜 : 2000-11-28 오후 8:46:37 조회 : 150?
* 며칠간 광주에 다녀왔더니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두에게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 이 글을 남깁니다.
1.아버지에 대하여
일주일째 혼자 입원해 계신다는 아버지 소식을 뒤늦게
듣고 광주에 갔지요.
일부러 연락도 안하고 간 제가 “아버지” 하고 들어서니
깜짝 놀래시더군요.
담낭에 염증이 생겨 치료받은 것인데, 수술 한것도 아닌데,
뭐하러 왔냐고
야단 하시더군요.
“아부지(전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한답니다.)
보고싶어서 왔다”고
손을 덥썩 잡으니 아버진 고갤 숙이더군요.
허허 너털 웃음과 함께…
병실엔 모두 보호자가 있는데 울 아부지만 혼자
신문보고 있드라구요.
하긴 제가 봐도 환자 같진 않았어요.
그래도 환자 혼자 있는것은 왠지 쓸쓸 하답니다.
예전에 제가 그렇게 이틀간 혼자 있어봐서 아는데
정작 주위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조금 외롭더라구요.
남편도 출장 중이었고, 대수롭지않는 병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수술후 오한이 들고 마취가 덜 깼는데
화장실 가다 넘어질 뻔 했을 땐 조금 후회도 되었답니다.
남편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러다 수술이 잘못됐다면 어쩔려고 그랬나 하는
후회 같은 게 생기더라구요.
그러면서도 ‘주위사람 신경 안쓰게 하는게 낫지’ 하고
위로 한 적이 있었지요.
이젠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신세 좀 지면 어때요? 제가 나중에 갚으면 될텐데…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울아버지 마음을 잘 알것 같았어요.
왜 자식에게 알리지도 않았는지…
백두산 여행 갔다고 하시구선 입원하신 그 마음을.
그리고 혼자 병실에 계신 마음이 어떠하실지.
더군다나 엄마도 안 계시는 상황이라 더욱…
병실 환자들은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어렸는데
울아버지가 제일 젊게 보여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대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버진 늘 부지런하고 정정하신 분이라 환자복이
안 어울렸어요.
전날 하루종일 아버지 입원소식을 듣고 속을 태웠는데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못오게 했어도 오길 잘했다 싶드라구요.
근데요, 아버지 염색 안된 뒷머리를 보니 조금
마음이 아파지대요.
여태껏 그런 모습 본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아, 엄마가 안계시는구나’를 실감 했지요.
1층부터 8층까지 날마다 오르내리셨다는 그 길을
아버지 손 잡고 함께 걸었어요.
어깨랑 다릴 주물러 주면서 ‘울 아버지 발이 이렇게
생겼구나’ 모처럼 자세히 볼 수 있었지요.
아픈 엄마 신경쓰다보니 아버지 안마 해드린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저녁을 드시자 마자 피곤하니 어서 가서 쉬라며
절 쫓으시대요.
전 아버지 옆에서 잘려고 했는데 보호자들이
모두 다 가는거예요.
할수없이 병실을 나왔지요.
근데 울아버지가 어느새 환자복을 벗고 나와서
절 동생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간다해도 걸어서 10분도 안걸린다며 앞장서서 휙 가는데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실 동생댁에게, 집에 안가고 친구 만나고
친정집에 가서 자든지 할테니 신경쓰지 말고 푹 쉬라고
전화했거든요.
동생댁이 감기에다 단식을 해서 많이 아픈 것 같아 ‘
‘나 있는 동안엔 병원에도 오지말라’고 했는데
아버진 그것도 모르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도 동생집에 들렸다 가야 한다며 벨을 눌렀어요.
아픈 동생댁 얼굴만 보고 물 한모금 안먹고 나왔지요.
제 몸도 아픈데 직장 다닐라, 시아버지 병원 들여다 볼라,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저보다 더 날씬해진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다 병간호 한다고 내려온 시누이까지 와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서둘러 나온 것이지요.
아버진 병원으로 들어가시고
전 친구가 동생집 앞으로 데리러 와서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그 뒷날 병원에 있다가 저녁엔 친정 집으로 갔지요.
일주일이 넘게 비어있던 집이라 냉방이더군요.
먼저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옷걸이마다 걸려있는 옷,수건들을
다 걷어 세탁기에 돌렸지요.
추운 곳에 있으려니 덜덜 떨리고 청소를 하려면
뭘 먹어야 될 것 같아 라면 하나를 끓였지요.
도저히 먹히질 않아 두세번 먹다가 한 쪽으로 밀쳐놓았더니
라면은 금방 퉁퉁 불대요.
냉장고 청소를 시작했지요.
반찬은 이것저것 있었지만 상한게 많았습니다.
전화할 때 마다 걱정도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말은
거짓이었음을
알수 있었지요.
눈물 한소금 쏟아내며 그릇들을 빡빡 소리가 나게 문질러 씻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엄마가 나으셔야 할텐데’
그 생각만 하면서 말입니다.
12시가 훌쩍 넘긴 시간 까지 말입니다.
그 시간 울아버진 내가 동생댁에서 자는 줄 알고 푹 주무셨을 겁니다.
춥다고 절대 친정 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거짓말을 한게 죄송했지만 퇴원하기 전에 집청소도 하고
동생댁도 푹 쉬게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빨아놓은 와이셔츠들을 다리면서
참 흐뭇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더러 아버지 와이셔츠를 다린 기억이
있지만 결혼 후론 처음이었으니까요.
울아버진 집에서도 와이셔츠를 즐겨 입었는데 그런 모습이 참 단정하게 보이고 기품있었지요.
아침도 굶은채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를 만났더니
수술을 하려면 간수치가 떨어질때 까지 더 입원해야 된대요.
물론 수술 안하고 싶으면 그 날 퇴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간 수치가 정상이 되면 그때 수술하던지 하고
일요일날 엄마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도 혼자 계신 아버지 걱정에 더 아프신 것 같아
두 분을 만나게 하는게 우선일 것 같아 퇴원 했지요.
그렇게 9일 만에 아버진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 날 저녁 엄마보다 훨씬 음식솜씨가 없는 전,
이것저것 반찬을 만들어 저녁상을 드렸지요.
역시 결혼 이후 처음으로요…
울아버지 제 얼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대요.
“아가, 너 어디 아프냐? 왜 그렇게 얼굴이
못써져가냐?”(핼쓱하다는 뜻) 하시며
절 자꾸 바라보는데 바보처럼 눈물이 나올려고 했어요.
울아버지 목소리도 조용하고 정이 묻어나는데
눈시울 안 붉어질 재간이 어딨겠어요?
더군다나 난 울보 딸인데…
아버지와 집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날 시댁으로 갔지요.
아버진 그 뒷날 견우와 직녀처럼 엄마를 만나러 가셨답니다.
덧 붙이는 말; ‘도대체 자식이 뭐길래’를 읽으신 분 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엄마는 말기 암환자로 요양소에서 치료 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