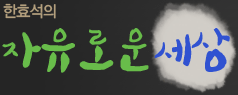선생님, 화를 내십시오
‘교육자 집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어렸을 적엔 흔히 들을 수 있었다. 뭔가 잘못
할 적엔 채찍의 의미도 그 말 속엔 담겨 있었다. 그만큼 주위에서 보는 기대가
달랐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이 다 그래도 너만은 안 된다는 엄한 경고의 뜻도
물론 있다.
그러기에 자기집이 부자라고, 혹은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녀석을
봐도 전혀 기죽지 않았다. 까불지 마! 내가 어떤 집 아이인데. 긍지 같은 게 있
었다.
좀 답답하고 넉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집안엔 추상 같은 규범이 살아 있었다.
바르고 곧은 기품, 그리고 청빈을 자랑으로 아는 선비 의식이 살아 있었다. 누
가 감히? 묘한 오기 같은 것도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의 여느 가정처럼 평범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였다. 대단한 집안도 큰 인물도 물론 아니다.
하지만, 혼담이 오갈 때는 교육자 집안은 그 위력을 발휘했다. 굵직한 다이아몬
드 반지는 기대할 순 없지만 사람 하나만은 자신 있다. 인간적인 면에서 품질 보
증이다. 가정 교육 착실히 잘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렇듯 교육자 집안이
란 이름은 우리 사회 중산층 문화의 산실이 되어 왔다. 사회가 아무리 흔들리고
허영·사치로 타락하더라도 그래도 교육자 집안은 동네 버팀목이 되어온 것이다.
교사 자신도 중산층 문화의 본보기로서, 모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말
없이 분위기로 가르친 것이다. 그리고 옛날엔 이웃도 학생도 그런 선생을 본받
고 따랐다.
불행히 요즈음엔 서당의 훈장 같은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젠 옛날처럼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사회 계층이 다르고 가치관, 생활 양식까
지 엄청나게 다른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 모여 있다. 중산층 배경의 선생으로선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
외제차로 등교하는 아이, 천연덕스레 거짓말하는 아이, 선생에게 대드는 아
이…. 황당하기 그지없다. 어떤 집에서 자라났기에 아이가 저 모양일까.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참으로 황당하다.
그런 부모가 촌지를 감사와 존경의 뜻이 아닌 뇌물로 변질시켜 놓았다. 사랑의
매를 폭력으로 매도했다. 촌지 교사·폭력 교사로 매도당했으니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 그래서 이젠 화를 안내기로 한 선생이 되고 있다. 교실이야 붕괴되든 수업
이야 되든 말든 체념하고 그냥 조용히 맡은 수업만 하고 나온다.
아! 선생님, 화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아이를 선생님마저 화
를 안 내신다면 아이들의 장래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선생님 화를 내셔야 합니
다. 내 아이 키우듯, 내도 크게 내야 합니다. (<교육소식> 2000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