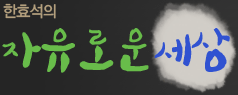우리 언니 -권명옥
우리언니
권 명옥(주부, 49세)
언니는 고생스럽고 힘들게 자랐다.
육 남매 장녀로 태어난 언니는 우리 집 살림 밑천이었다. 농사일 거드시면서 집
안 살림에 바쁘신 엄마를 도와 동생들을 업어 키우다시피 했다. 농사철이 시작
이 되면 학교 가는 날보다 결석하는 날이 많았다. 모내기하는 날이나 김매기하
는 날, 벼 베고 타작하는 날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사람 모여 일하는 날이면 당
연히 학교를 못 갔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부르시는 대로 움직였다.
젖먹이 동생을 업어주면서 큰 동생도 같이 데리고 놀아 주어야 했다. 집과 논으
로 오가면서 물 심부름, 담배 심부름도 해야 했다. 어느 농가나 마찬가지로 비슷
하다. 우리 집에 널려 있는 게 일이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으셨던 엄마에게 언니는 가려운 곳마다 구석구석 긁
어 주는 효자 손이었다. 풀이 많은 곳으로 소도 갖다 매어 놓고 돼지죽도 퍼다
주었다. 2㎞가 넘는 길을 걸어서 학교에 갔다오면 책보자기를 마루에 놓기 바쁘
게 엄마는 언니 등에 동생을 업혀 주었다. 동생 봐주기가 너무 지겹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늦게 오는 날에는 호되게 야단도 맞았다.
언젠가 언니는 학교까지 동생을 데리고 가야할 처지가 됐다.
두세 살 터울의 출산에 산후 조리가 부실하셨는지, 엄마가 편찮으신 것이다. 뚜
렷한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아 누워지내셨다. 화로 불에 한약을 자주 다렸다.
씁쓰무리한 한약 냄새가 집안 여기저기 배었다. 언니는 그나마 다니던 초등학교
도 졸업을 못하고 그만 두었다. 꿈과 희망도 없이, 욕심도 없이 어린 나이로 우
리 집 형편에 맞추어 살았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짓고 설거지도 하였다. 개울가에 나와서 빨래도 해
왔다. 언니는 엄마가 시키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도 했다. 내가 초등학교 입
학도 하기 전 한글을 가르쳐 준 것도 언니였다. 구구단도 달달 외우게 가르쳐 주
었다. 동네 친구들과 홀가분히 놀 틈도 언니에겐 없었다. 일만 하는 어린 것이
안됐다 싶으셨는지 엄마가 가끔은 가만히 눈짓을 하신다. 나가서 친구들과 놀
다 오라는 신호였다. 눈치 빠른 나는 기어이 쫓아갔다. 언니 친구들에 곱지 않
은 눈총을 받으면서…… 왜 그랬는지? 잠시라도 언니를 편하게 못해 주고 찰
거머리처럼 쫓아다닌 내 어릴 적 행동이 쥐어박고 싶도록 얄밉다.
지난 해 텔레비전에서 50, 60대 어른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 동안 한글도 모른
채 살아오다가 주부 교실 한글반에서 글자를 깨치신 회한의 눈물이다. 이런 사
정 저런 이유로 못 배우셨던 그 분들이 모두다 우리 언니들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