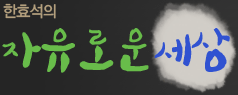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강원도 버스 -권명옥
권 명 옥(주부, 부천시 상1동 반달마을)
지난 주말, 꿩에 관한 전설이 얽힌 치악산 상원사를 찾아 나섰다. 구렁이로부
터 어린 꿩을 보호해준 선비, 그 선비의 생명을 죽음으로 보은하는 꿩의 이야기
가 애절한 곳이기에 오래 전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치악산은 오래된 유명 사찰과 기암 괴석이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 산세가 험준
해 등산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일행은 체력에 무리가 덜 가는 길을 택했다. 원
주에서 제천 방향 고속 도로를 타고 신림으로 갔다. 성남리 성황림을 지나서 아
스팔트 포장된 도로까지 차로 갔다. 바람은 산들거리고 햇빛이 따뜻해 걷기에 좋
았다. 시냇가에 버들강아지가 포실 포실 피어 있었다. 길가에는 꽃다지 노란꽃
이 피고 하얀 냉이꽃이 피어 작은 바람에도 한들거린다. 일상에서 빠져나온 자유
로움에 콧노래가 절로 새어나온다.
흙길을 걷는 발걸음이 편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는 이 산골길. 말이
없어도 즐겁고, 손을 잡지 않아도 다정하다. 산모퉁이를 돌아서 매표소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글씨가 보인다. ‘입산금지’
어쩐지 이상했다.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오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차들만 서
너 대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을 뿐이다. 해마다 산불이 잦은 봄철이면
입산금지가 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리석음에 짜증이 나서 길바닥
에 있는 돌부리를 발로 걷어찼다. 신림 읍내까지 버스가 하루에 두 번 있다는 매
표소 직원의 친절한 말을 듣고 오던 길 다시 돌아서 걷는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
간이면 차라리 걷는 게 빠를 것 같다.
허탕친 분위기를 거두려고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걷는다. “바위고개 언덕을 혼
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납니다…” 우리 일행 말고 듣는 사람 없어서 마음
껏 편하게 부른다. 둘러멘 배낭이 무겁게 느껴지고 목도 마른다. 음료수 한 모금
을 마시고있을 때 봉고 트럭이 보인다. 손을 들었다. 차가 우리 앞에 와서 멈춰
섰다. 건강한 시골 아낙이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탔다.
상원사까지 못 오르고 되돌아온 이야기를 듣자, 운전사가 이 고장 주인답게 우
리를 위로한다. 산불이 날까봐 그러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6월 달에 다시
한번 오라면서 우리 일행을 신림읍에 내려준다.
단층 건물로 늘어선 신림 읍내는 한산하다. 옷가게, 미장원, 슈퍼, 만물상 없
는 게 없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열대여섯 명 된다.
누구네 잔칫집들 가는 건지, 선거 유세장에 가는 건지, 제 나름대로 단장을 하
고 있다.
원주까지 가는 버스가 왔다. 우르르 올라타자 버스가 출발한다. 2차선 도로는
구불구불하였다. 마을이 있는 곳마다 정류소가 있다. 손님이 탈 때마다 운전기사
와 인사를 한다.
“어유, 오랜만이네요?” “어디가세요.”
주고받는 말이 수더분하고 꾸밈이 없다. 버스가 정류장을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저기 사람 오네”하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뛰어나오고 있
었다. 버스기사가 출발을 늦추고 기다렸다가 태우고는 원주를 향해 달린다. 어디
쯤 왔을까. 버스가 서고 문이 열리면서 할머니가 커다란 짐보따리를 들어 차에
실으려 한다. 어디에 앉아있던 사람인지 성큼 내려가서 그 짐보따리를 받아 차
에 올려놓고는 그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느긋하게 버스가 출발을 한다. 푸근한 삶이 눈에 보
인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들인데 아름답게 보인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들이기에 외경심마저 든다. 사람을 태운 버스가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