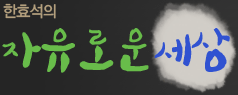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내 친구 ‘라렌’ -이연진
이연진(주부, 부천시 상1동 한아름 아파트)
<라렌>과 나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연합고사를 준비하던 중학 시절에는 비탈
진 해방촌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함께 과외 공부를 하기도 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 어느 날, <라렌>은 신학생이 되어 나를 찾아왔다.
어린 시절에는 그저 짓궂은 아이로만 생각되었다. 그런데 제법 의젓하고 단정한
모습을 갖춘 청년으로 변해 있었다. <라렌>은 내 방 한쪽 구석에 놓여진 낡은 기
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나는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친구에게서 깊은 사색과 함께 맑은
영혼이 깃들여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노래 속에 잠겨 바닷가 어
느 바위섬에서 부서지는 파도가 되어 보기도 하고, 갈매기가 되어 쓸쓸한 바닷
가 위를 날아보기도 하였다. 그 후로 나는 다시 일상에 젖어 들었지만 ‘바위
섬’이란 노래가 들려 올 때면 언제나 친구의 맑은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둘째 아이를 낳을 무렵, <라렌>이 사제 서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달려가 축하를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산후 조리를 하고 있는 편치 않은 몸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선택한 길에 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그리고 어느 덧 십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라렌>이 강원도 ‘현내리’ 어느
한 성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급히 전화기 앞에 다가 섰다.
“신부님! 저…. 연..진…이..에…요…”
“어…. ? 연진이….?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
<라렌>은 그곳에서 마음 편히 잘 지낸다며 ‘정동진’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 가
족들과 함께 꼭 다니러 오라는 정겨운 말을 남겼다. 그렇게 간단한 안부 인사를
전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라렌>을 잠시 만날 수 있었다. 어느 환자를 방문하
기 위해 <라렌>이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양쪽 눈 끝이 살짝 내려
가 사람이 좋아 보이는 눈매를 갖고 있는 <라렌>은 사색이 드리워진 눈망울로 더
욱 순박해 보였다. 또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해맑은 얼굴에는 시간
을 잘 보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었다.
<라렌>은 자전거를 타고 약수터에도 가며 개울물에 발을 담그고 하늘을 본다고
했다. 가까운 산에 오르기도 하고 낚시도 하며 ‘현내리’ 사람들과 즐겁게 생활
하는 이야기도 해 주었다. 또한 강원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나무와 풀
들의 이름과 갖가지 열매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라렌>은 먼 곳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곧 아래로 향했다. 공원 바닥에 떨어진 열
매껍질을 주워 들며 나지막이 웃어 보이는 친구의 얼굴에는 어느새 ‘현내리’
의 풋풋한 정이 묻어 나고 있었다. 푸른 숲의 자연과 가까이 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청빈하게 살아온 생활 때문이었을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라렌>의
얼굴은 이른 새벽 흐드러지게 피어난 하얀 철쭉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잠시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라렌>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변하지 않는 아
름다움을 간직한 친구의 모습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고이 머물러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태백산 자락의 물줄기도 한 없이 흘러 내려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