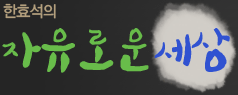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추억의 고향 -신옥
신 옥(주부, 경기도 부천시)
고향이란 누구에게나 아련한 향수와 함께 기억하고싶은 추억을 안고 있다. 철
든 이후 줄곧 도시에서만 자란 내게도 어린 시절의 고향은 무성영화의 한 장면처
럼 희미하게 남아있다. 10년 동안 자란 고향의 그 희미한 끈을 놓치고 싶지않는
안타까움이 늘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한 번쯤 꼭 가고 싶었던 고향을 바쁘고 멀다
는 핑계로 가슴에만 담아두고 지냈다.
그런데 결혼이후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고향을 생각지도 않게 갔다올수 있었
다. 16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차 평소에 하던 멀미도 안
하고 차창밖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친정 아버지의 땀이 배어있던 방앗간은 마을 창고로 변해
있었다. 어른들의 쉼터이자 우리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던 우산각이란 정자도 새롭
게 개조된 채 옛 모습이 아니었다.
마을 안으로 조금 들어서면 있던 아랫마을의 깊고 커다란 우물은 먼지와 쓰레기
가 떠 있었다. 볼 때마다 우물가를 꽉 채워 발 디딜 틈도 없었던 우물가엔 아무
도 없었다. 그런데도 빨래와 채소 등을 씻으며 수다를 떨던 동네 아낙네와 처녀
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난 마치 ‘툼벙’ 하며 두레박 떨어지는 소리
가 들려오는 것 같아 우물안을 내려다 봤다. 맑은 물위에 원을 그으며 물속 깊
이 잠수한뒤 시원한 샘물을 넘치도록 담고 올라오던 두레박이 우물안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 같았다. 사철나무로 둘러싸여 포근하고 넓고 깨끗하기만 하였던 우
물가는 이젠 텅 비어있었다.
윗마을 아랫마을을 잇던 골목길은 채 일 분도 안되는 거리인데도 심부름 가는
어두운 밤에는 까마득히 멀고 길게만 느껴졌다.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길 것 같
아 등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끝이 없는 길처럼 생각되었었다. 울퉁불퉁 작은 돌
들로 가득찼던 골목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던 어린 내 모습도 함께 떠올랐
다.
윗마을 우물이 보이자 심장박동소리가 귀에까지 울려왔다. 그 우물을 지나가기
전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10년간 살았던 우리 집이 있기 때문이었다. 목수일
도 하셨던 솜씨좋은 아버지가 만드신 지붕까지 닿았던 그 커다란 대문이 지금도
있을까?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빨라졌다. 아, 다행히도 대문은 열쇠로 잠긴 채 굳건하
게 서있었다. 사립문뿐이었던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우리 집 대문은 옛날
그 모습대로 당당하게 지키고 있었다. 색깔은 조금 변했어도 모양을 새겨넣은 나
무 대문은 40년이 넘은 세월에도 끄떡없이 건재했었다. 대문을 가만히 손으로 쓸
어 만져보았다. 뿌연 먼지와 함께 대문앞에서 장롱이며 책상, 심지어 타고 놀아
라고 운전대까지 달린 나무차를 만들어 우리를 놀랍게 하시던 젊은날의 아버지
가 웃고 계시는 듯 했다.
대문에만 열중하다 뒤늦게 옆을 보니 집이 보이지 않아 순간 놀랐다. 집을 폐가
로 남겨놓기 싫어 몇 년전에 허물었다는 작은 아버지의 말씀이 텅빈 집터에 울려
퍼졌다. ‘그랬었구나. 집이 없어졌었구나.’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래도 우리에게 맛있는 감을 주었던 감나무가 남아있어 한참을 올려다 보았
다. 텅빈 집에 텅빈 나무에도 까치집이 있었다. 집터를 둘러보며 부엌과 안방,
그 사이에 광이 있었고 작은 방앞에 불을 때던 아궁이까지 머리 속에 그려보았
다. 아궁이에서 감자나 고구마 굽는 냄새가 대문을 말고 들어서면 진동하곤 했
다.
여름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누워 별를 보다가 잠이 들기도 했고 갑작스
레 내린 소낙비에 놀라 잠에서 깨기도 했다. 수제비를 끓여 솥채 갖다놓고 푸짐
하게 먹었던 일들이 마치 몇 년 전의 일인냥 생각되었다.
장독대가 놓여있던 뒤쪽으로 옛날처럼 돌아가 보았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더
러는 땅속에 묻혀 냉장고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그 속의 물건들이 늘 우리의 궁
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엄마가 장에 가신 틈을 타 오빠들과 난, 땅 속의 항아리에
서 그때만 해도 귀한 멸치를 꺼내기로 했다. 오빠가 바닥으로 엎드리고 우린 오
빠의 한손을 잡고 서로서로의 손을 잡은채 뒤로 버티고 오빠는 항아리에 손을 집
어넣었다. 그런데 어깨까지 들어가 꽉끼는 바람에 우리 힘으로 오빠를 꺼내지
못해 겁이 나 온 동네가 떠나가게 울었다. 한참 후에야 장에서 돌아오던 아랫집
아줌마가 겨우 꺼내주었던 일이 생각나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장독대 뒤에 울창하게 들어서 있던 대나무를 바라보았다. 어쩌다 밤
에 깨기라도 하면 밤새 바람소리에 맞춰 사각거리던 대나무소리가 무서워 이불
을 뒤집어쓰며 잠들기를 기다렸었다. 그 기세등등하던 대나무도 힘을 잃은 듯 조
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비록 고향집이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었어도 내가슴
엔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치 못다 푼 숙제를 다 한 것 마냥 마음은 한
껏 부풀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