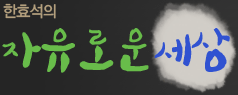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수필) 옆집 아주머니 – 권명옥
권 명 옥 (주부, 부천시 상1동 반달마을)
큰 아이가 젖 먹던 갓난아기 때 우리는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 수봉공
원 산기슭에 초록색 기와를 얹은 양옥집에 방 하나에 부엌하나 달린 셋방이었
다. 야트막한 블록 담을 사이에 두고 옆집 부엌문이 우리 사는 부엌문과 마주보
고 있으면서 거리마저 가까웠다. 부엌을 거쳐야만 방으로 갈 수 있는 셋방은 부
엌문을 열어 놓고 연탄불을 갈거나 방안 환기조차 시키기가 편치 않았다. 담 너
머 옆집에서 본다면 볼품없는 살림살이 전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있어 여간 불
편하지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낯가림을 잘 타서 되도록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인기척이 없는 틈새를 타서 골목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었다. 밖에 일을 얼른
하고는 부엌문을 닫고 살았다.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떡 인
사를 하고 지냈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기 기저귀와 옷가지를 빨아놓고 널지를 못하고 있었
다. 주인집과 함께 쓰는 빨랫줄에 주인집 빨래가 가득하니 널 자리가 없는 것이
다. 세숫대야에 수북히 젖은 빨래를 담아놓고는 널려있는 빨래가 마르기만을 기
다리는데, 옆집아주머니가 “애기 엄마, 그 빨래 이리 줘요. 탈수기로 돌려줄
게.”하며 담 너머에서 팔을 뻗쳐서 널지 못하고 있는 빨래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 동안 말도 없이 지난 사이라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마른 기저귀가 급한
터라 주저하지 않고 세숫대야를 들어 넘겨주었다. 담을 넘어간 젖은 빨래는 탈수
기 통에서 맴을 돌고 그 집 빨랫줄에서 바싹 마른 채로 담을 넘어왔다. 고맙다
는 인사를 옆집 아주머니는 웃음으로 받으셨다. 탈수기 통에서 맴을 도는데 재미
를 부친 젖은 빨래는 그후도 가끔씩 담을 넘어가서 맴을 돌고 넘어왔다.
낮은 담과 가까운 거리 때문에 껄끄럽기만 하던 옆집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머니
배려로 조심스레 풀어지고 있었다. 닫혔던 부엌문을 열어놓고 얼굴을 마주보고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다문 입도 열어 놓았다. 아주머니는 고향이 개성이라 가
까운 친척은 없지만 동생이 여덟이나 된다고 맏딸로써 버겁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셨다. 9남매 맏이로 커온 후덕한 모습에 아주머니는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끌
어안아 줄 도량이 넉넉하였다.
손바닥만한 공터에 들깨와 고추를 심어서 깻잎과 풋고추를 따서 나누어주었고 콩
나물을 사러 가거나 두부를 사러 갈 때도 나를 불러 함께 다녔다. 갓난아이 목욕
을 시킬 때는 하던 일도 멈추고 도와주었다.
옆집 아주머니의 인정에 기대어 어느덧 야속한 셋방살이 어려움이 묽어져 갔다.
비오는 날이면 호박 부침개가 담을 넘어와서 심심한 입을 즐겁게 해주었고, 김
치 송송 썰고 참기름 쳐서 만든 비빔국수도 자주 담을 넘어왔다. 한여름 더운 날
에는 얼음 띄운 미숫가루를 타서 시원하게 먹으라고 건네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식성을 몰라 주춤거리면서 주셨는데, 나중에는 아주머니 입맛에 맞추어 건네주
는 사이가 되었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다. 낯선 곳에서 다정
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친동생 챙기듯 보살펴 주신 옆집 그
아주머니가 종종 생각이 난다. 갚을 수도 없이 많은 인정을 퍼주셨던 옆집아주머
니를 생각하면 염치없던 그때가 너무 뻔뻔스러워 지금도 부끄러워진다. 어쩌자
고 받고만 살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