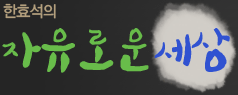지금 우리 엄마는…-신엘라
이름 : 신엘라 ( sok0822@hanmail.net) 날짜 : 2001-02-13 오후 9:36:41 조회 : 168
얼굴은 주먹만해지고
텔레비전에서만 보았던 아프리카 난민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고
처녀가슴처럼 예쁘기만했던 젖가슴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배만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부풀어올라
겨우 뼈만 있는 저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제 무게를 견딜수 있을까?
걱정만 하다 걱정만 하다 입술만 부르텄다.
2.
보름만에 만난 엄마
다리만 포동포동 해졌다.
늘 서너살 아이처럼 뽀얗고 부드러운
그 곱던 속살이 다시 되살아났다.
순간 ‘너무 예쁘다’ 감탄사가 나올만 하다.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어있는 그 발을 보고있다보면
바늘을 가져다 콕 찌르고싶다.
꽉 차 있는 바람이 살그머니 빠져
엄마가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소변도 콸콸 쏟아져 나올 것 같다.
3.
신부님도 오고
수녀님도 오고
교우들도 오고
멀리 있는 일가 친척도 오고
엄마 친구도 오고
가까운 이웃들도 오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오고
예쁜 꽃도 가져오고
죽도 쑤어오고
국도 끓여오고
돈도 드린다.
4.
‘그래도 복있는 분이다’
‘행복한 분이다’
그말엔 조금 섭섭하고…
‘왜 이 착한 사람을 하느님은 벌써 데려가려고 하느냐?
고통 받을 이유가 도대체 있기나 하느냐?’ 고
오열하는 이 앞에선
난 눈물대신
엄마의 삶이 아름다웠음에 감사드린다.
집에 가선 술을 마시고 펑펑 운다는 외삼촌은
엄마앞에선 차마 눈물도 못보이신다.
외삼촌은 나랑 닮았다.
5.
개학 전날까지 엄마를 간호했던 언니는
역시 큰 딸이었다.
자신의 미술 전시회도 가지못하고 엄마 곁에 있었다.
그리고 2년 동안 마음대로 먹지도 못한 엄마가 안쓰러워
오늘은 싱싱한 굴과 꼬막을 사가지고 와서
엄마 입에 넣어드렸다.
그 동안 철저히 음식 절제를 했던 엄마도
맛있게 받아드셨다.
‘참 맛있다……’
그렇게 엄마가 말했다.
난 울컥한 심정에 먹던 굴이 목에 걸렸다.
난 싫었다.
엄마가 저렇게 음식을 막 먹다보면
더 빨리 가셔버릴것 같았다.
못 먹더라도, 누워 있더라도
더 오래 계셨음 좋겠다.
언니는 이제 엄마를 보내드리기로 했나보다.
먹고 싶은 것이라도 드시게 하고 싶단다.
난 아직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맛있게 드시는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제일 맛있게 생긴 굴을 집어
엄마 입에 넣어드렸다.
그렇게 열심히 식이요법을 했던 엄마가
‘다음주에 올때도 굴을 사오라’는 소리에
갑자기 멀미를 하는 것 처럼 어지러웠다.
엄마도 가실 준비를 하시나 보다.
난 아직은 보낼 수 없는데……
.
.
.
엄마는 나보다는 언니하고 더 통하나보다.
6.
‘다음주 토요일에 또 올게요’ 하며
일어서는 내게
‘냉동실에 마늘 가져가라,
소금 항아리에 있는 참기름 가져가라.
너 좋아하는 브라질 커피 가져가라.
무공해 더덕 가져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 ‘
그 소리만 하는 우리 엄마는 바보.
자식에게 주고싶은것 많아
자신의 생명을 하느님이 가져가시려는 것 조차
순간 잊으신다.
우리 엄마는 정말 바보다……………..
2001년 2월 1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