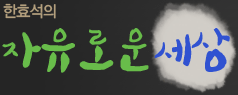청소년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름 : 어느 학부모 ( ) 날짜 : 2001-03-26 오후 4:39:17 조회 : 161
토론 원고를 준비하는 나에게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묻는다. “그 토론회에 청소년 애들도 나와? 주인도 없는데 왜 즈들끼리 난리 부르스야. 관심은 원하지만, 보호는 사절이야!”
내 딸아이와 그 친구들 마음의 지도를 그려내고, 생각을 짚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 대목이다.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일본 영화가 말하듯 ‘자료 검색’의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현장’을 알아야 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사건을 풀어야 한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면 우리는 문제 상황을 분석하거나, 서둘러 보호책 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위해 생각을 모아야 한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과 절망이 무엇이며, 욕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가? 이들의 꿈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가? 아무 것도 되고 싶은 것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다.
퇴폐적인 성인들의 놀이 문화, 황폐한 가정,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왜곡된 성,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부터 아이들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망이란 없다. 이 시대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부모, 인간을 기르기보다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공정성 없는 사회. 이 사회가 아이들을 맘 붙일 곳 없이 내몰고 있다.
‘여고괴담’에는 9년째 학교 다니는 귀신이 등장한다. 그러나 아무도 아이의 존재를 모른다.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누구 눈에 띌만한 말썽을 부리지도 않는 조용한 아이. 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 아이의 존재가 섬뜩했다. 학교는 서로를 소외시키는 냉혹한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학교가 보다 유연해져야 하고, 그 유연함이 사회와 자연스레 연결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닐만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목매지 않는다. ‘학교붕괴 현상’은 학교에 목매지 않는 아이들의 출현에 학교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학교에 다닌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떠해야 할까?
1.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권리를 깨우쳐주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그 권리를 확장해주는 공간으로 학교가 기능해야 한다.
2. 아이들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애를 서울대 입시 준비생 키우듯하는 전쟁. 어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면, 우리는 사회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학벌 사회, 학연의 고리를 끊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3. 집단주의적 학교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아이들을 개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의 대폭적인 감소이다. 이 교실 환경의 인간화가 집단주의적인 학교 문화를 극복하는데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문을 나서면 아이들은 학교 밖 아이다. 학교에서 벗어난 아이들, 학교를 외면하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고용 시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들을 소비자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력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의 노동권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들의 노동이 무시되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들을 좀 빨리 세상 밖에 나온 사람들로 인정하고, 그 권리가 지켜지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교 밖에서 생활과 공부를 함께 이루어갈 열린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리에 눈뜬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책임 있는 개인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확보하면서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인식하고, 확대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 대상화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간섭이 될지도 모를 보호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상호 이해의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학부모 신문 2001년 2월 5일자)